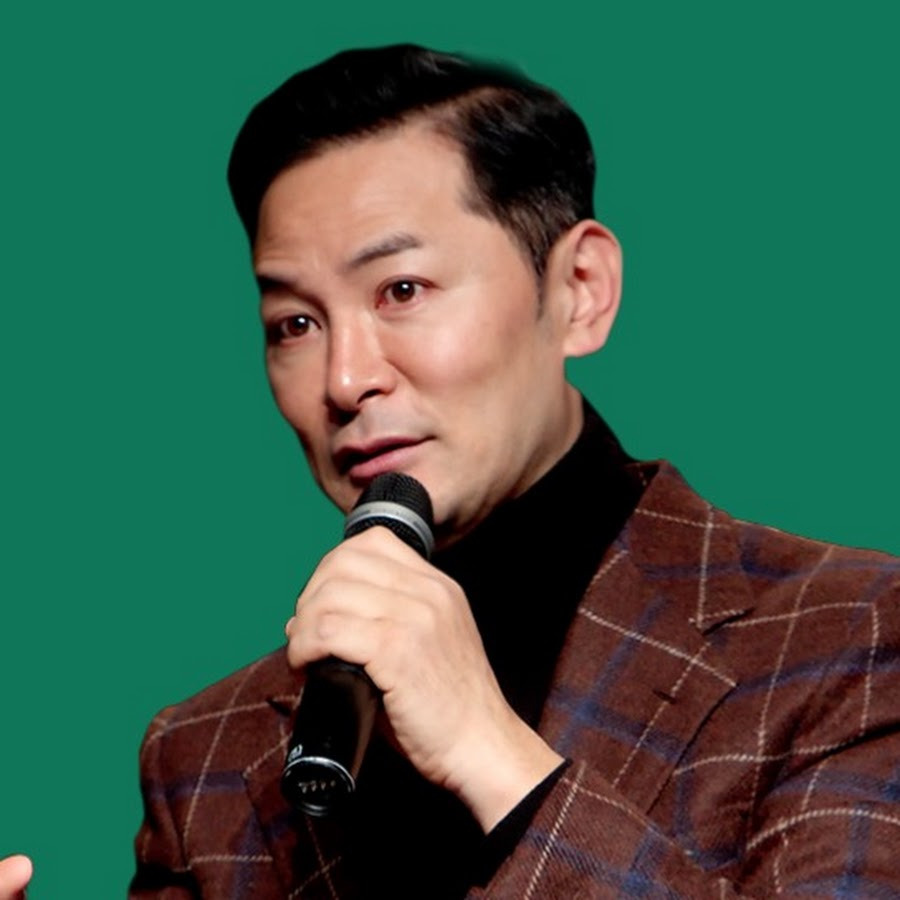
무대 위에서 늘 유쾌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던 김창옥 강사. 하지만 그가 밝힌 자신의 어린 시절은 믿기 힘들 만큼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청각장애가 있었지만, 문제는 귀가 아니라 마음의 벽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결혼식 날에야 남편의 청력을 알았고, 글도 몰라 두 사람은 평생 마음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술과 화투에 빠진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면 폭력은 일상이 됐고, 어린 김창옥은 늘 벌벌 떨었습니다.

그는 대학에 도망치듯 올라왔지만, 고향에 남은 어머니와 누나들은 여전히 맞고 있었습니다. 죄책감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아이를 낳고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와 마주하지 않으면 자신도 똑같은 상처를 물려줄 거라는 걸요.

수술로 아버지의 청력이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들리면 얼마나 더 괴롭힐까 무섭다”며 반대했습니다. 결국 수술은 성공했지만, 재활을 위한 언어치료는 어머니의 거절로 끝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대화 한 번 제대로 나누지 못한 채,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에도 상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폭력을 당했던 어머니가 몇 달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싸구려 돌침대에 누워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왜 그토록 미워했던 사람을 그리워하세요?”라는 아들의 물음에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창옥은 말합니다. “사람은 원하는 걸 알아야 하는데, 그걸 모르면 결국 누군가를 원망하게 돼요.” 그의 고백은 평생 ‘소통의 신’으로 불리던 자신도 사실은 가족과 소통하지 못한 아들이었음을 담담하게 드러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 그럴지 모릅니다. 미움과 사랑이 뒤엉킨 감정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일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