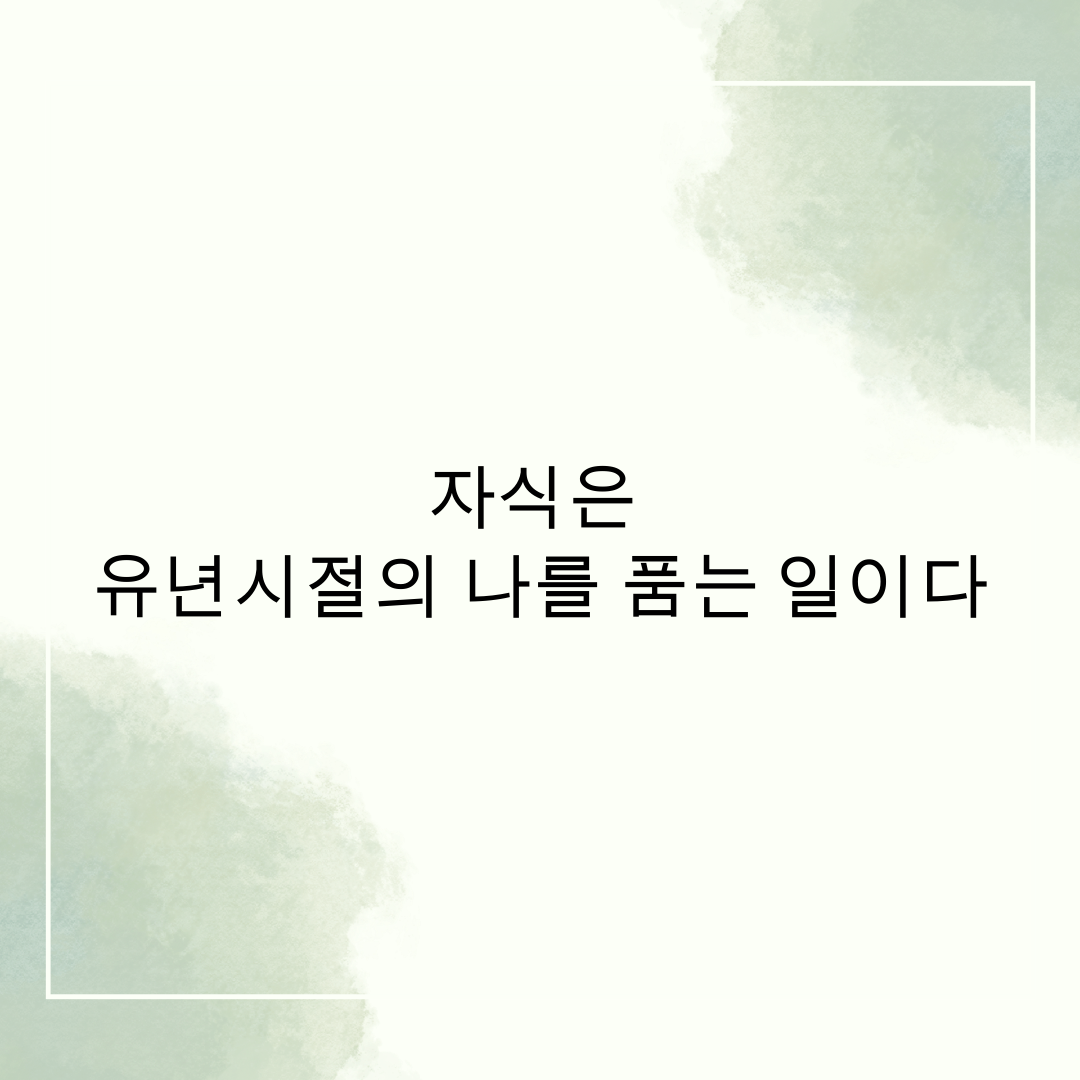
어릴 적, 말 한마디가 그토록 듣고 싶었다. 따뜻한 손길 하나가 그렇게 간절했다. 시간이 흘러 이제 내가 부모가 되어 아이를 안아주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그 품 속에서 자꾸만 어린 내가 울고 있다. 아이를 키운다는 건, 잊은 줄 알았던 내 상처를 마주하고 다시 어루만지는 일인지도 모른다.

내 아이를 돌보다 보면, 문득문득 그때 그 아이, 내 안에 남아있는 유년의 내가 얼굴을 내민다. 아이를 품으면서 나 자신도 같이 껴안게 된다.

그때 듣지 못했던 말들을, 이제는 내가 건넨다
“괜찮아, 많이 놀랐지?”, “힘들었겠다.” 아이에게 해주는 말들이 어느 순간 내 가슴을 울린다. 내가 그렇게 듣고 싶었던 말, 나에게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그 말들이, 이제 내 입을 통해 흘러나온다. 결국 그 말은, 지금의 내가 과거의 나에게 건네는 위로다.

아이의 눈물에 내 어린 날이 겹쳐 보인다
아이의 작고 붉어진 눈망울을 마주할 때, 가슴 깊이 묻어뒀던 기억들이 밀려온다. 나도 그랬을까, 나도 그렇게 누군가를 원했을까. 아이를 안아주는 순간, 어린 내가 그 안에서 눈을 감는다. 아무 말 없이 안기는 그 품 안에서, 말하지 못했던 외로움이 천천히 녹아내린다.

아이의 작은 행동이 내 기억을 흔든다
혼자 앉아서 소리 내 웃는 모습, 넘어지고도 다시 일어서는 순간, 내 손가락을 꼭 쥐며 잠드는 그 감촉. 하나하나가 과거의 나를 흔든다. 그렇게 나는 매일 아이를 통해 ‘그때의 나’를 다시 살아낸다. 그 시절 아무도 다독이지 못했던 나를, 지금의 내가 대신해서 다독이는 셈이다.

무의식에 남아 있던 감정이 아이 앞에서 흐른다
아이에게 화를 내고 돌아서서 눈물이 난 적이 있다. 미안해서가 아니라, 나조차 몰랐던 내 안의 억울함이 올라온 것이다. 부모가 된 나는, 나를 괴롭혔던 말들, 억눌렀던 감정을 아이 앞에서 비로소 마주한다. 그리고 조금씩, 용서하고 내려놓는다.

아이가 자랄수록, 나는 천천히 자유로워진다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게 많지만, 완벽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게 된다.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그때의 나도 조금은 괜찮았다는 생각이 든다. 아이가 자라면서 내가 놓아주는 건 기대나 욕심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지고 있던 나에 대한 자책감이다.

아이를 품는 일은 결국, 내 과거를 안아주는 일이다
사랑이라는 건 결국 돌고 돌아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 같다. 내가 아이에게 주는 사랑이, 언젠가 그리워했던 나를 치유하고 있었다는 걸 이제서야 알겠다. 부모가 된다는 건 단순히 누군가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나를 치유하는 새로운 방식이었다. 아이는 그렇게 내 인생의 두 번째 기회가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