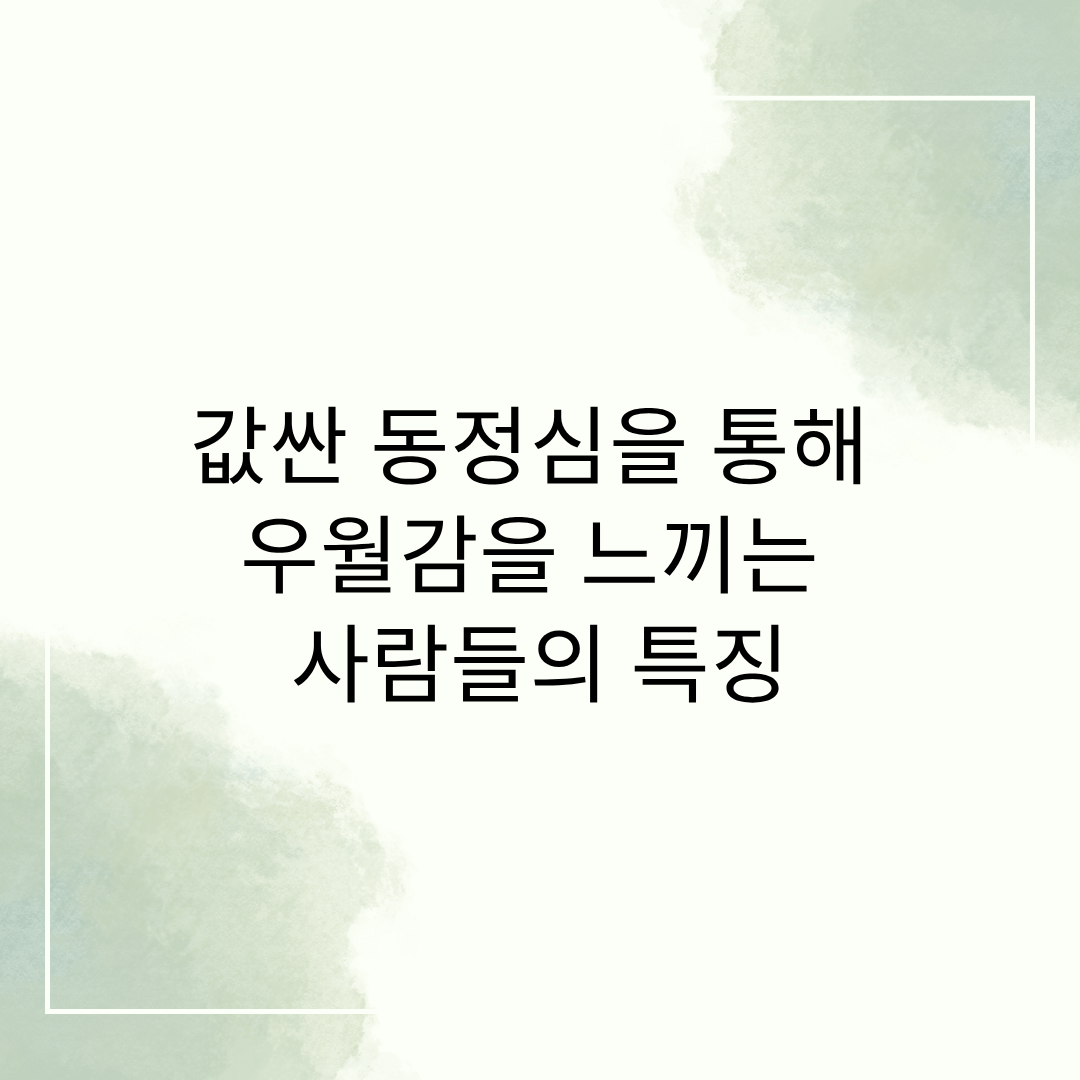
“넌 진짜 힘들겠다, 난 상상도 못 해.” “그래도 넌 예쁘다니까, 괜찮아.” “나라도 그랬으면 못 견뎠을 거야, 대단해.” 말은 다정하고 위로처럼 들리지만, 듣고 나면 어쩐지 기분이 나쁘다. 상대를 위로한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나는 작아지고 그 사람만 높아진다. 그 말 안엔 안쓰러움보다 ‘너는 아래, 나는 위’라는 시선이 숨어 있다. 결국 값싼 동정심이 우월감의 포장지처럼 사용되는 순간, 말은 따뜻해도 마음은 시린 채로 남는다.

1. ‘불쌍한 사람에게 말 예쁘게 해주는 나’에 취해 있다
진심에서 우러난 위로가 아니다. 그들이 관심 있는 건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사람처럼 보일까’다. 그래서 말 속엔 항상 자신이 들어간다. “난 그건 못 할 텐데 넌 해냈네”, “나는 절대 그렇게 못 살아” 같은 표현은 결국 상대를 격려하는 게 아니라, ‘난 괜찮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챙기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2. 칭찬인 척하면서, 기준은 자신이 정해놓는다
“그런 스타일은 난 못 입는데 넌 되게 소화 잘하네”, “예쁘게 봐줄 사람 있을 거야” 같은 말은 겉으로는 칭찬처럼 들리지만 사실상 ‘내 기준에선 별로지만 받아줄 수는 있어’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다. 이건 인정이 아니라 허락이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게 아니라, 이해해줄 수 있는 수준으로 내려다보는 태도다.

3. 상대가 약할수록 자신이 돋보인다
타인의 힘듦은 이들에게 도덕적 자존감을 채우는 기회가 된다. 곁에 서서 “난 그런 친구야”라는 이미지를 연출하고, “내가 들어줬잖아”, “내가 곁에 있었지” 같은 말로 자기 존재를 부각한다. 그래서 이들은 상대가 진짜 회복되길 바라지 않는다. 상대가 계속 약한 상태여야만 본인의 역할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4. ‘괜찮아’라는 말로 감정을 덮는다
진짜 공감은 함께 아파주는 거지만, 이들은 늘 “괜찮아”, “너는 할 수 있어”, “다 잘될 거야” 같은 말로 감정을 끊어낸다. 이 말들은 상대를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본인이 그 불편한 감정을 감당하지 못해 던지는 회피형 언어다. 결국 그 말은 감정의 연결이 아니라 단절을 만든다.

진짜 위로는 상대를 낮추지 않는다
값싼 동정은 위로가 아니다. 상대를 불쌍한 사람으로 설정하고, 그 위에 서서 던지는 말은 겉으론 다정하지만 결국은 통제다. 따뜻한 척하면서 스스로의 우월함을 확인하는 방식은 관계를 위로가 아닌 위계로 만든다. 말이 예쁘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다. 그 말이 나를 작게 만들었다면, 진심은 없다.



